일찍이 당나라 유우석은 누실명(陋室銘)에서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이 있고서야 명산이요, 물은 깊어서가 아니라 용이 있고서야 영험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오르고도 신선을 만나지 못했으니 어쩐 일인가? 그러나 비산비야(非山非野), 산인가 싶으면 어느새 제 높이를 깎아 언덕으로 도회하거나 주역, 겸괘(謙卦)에서 이르는 ‘땅속으로 제 몸을 숨기는’ 겸손한 산도 있는 법이다. 그럴진대 누가 거기 명산이 있는 줄 알아보고, 그리 오르려 하겠는가. 그뿐인가, 저 가야산 산문 밖 어디쯤 산나물 몇 움큼을 놓고 해동갑으로 나앉은 노친이나, 산정에서 서로 웃으며 따뜻한 차 한 잔, 과일 한 조각 건네는 산행객으로 짐짓 신선이 나투신들 우리가 어찌 알아보랴. 그런즉 산빛으로 눈을 씻고 새롭게 볼진대 온갖 미물과 이름 모를 새소리, 바위와 고사목, 청산녹수, 폭포, 저수지, 바다에 이르기까지 제가끔 천성과 때깔에 맞게 낳고 기르고 거두는 이 풍경 속에 어찌 신선이 깃들지 않았으며 왜 명산이 아니라 하겠는가.
기꺼이 몸을 낮춰 아무런 조건 없이 필자에게 어깨를 내어준 그 산들에 조촐한 글을 바친다.
산행 중 만난 많은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계단, 꼬부랑길, 분재 같은 나무, 갖가지 모양의 바위, 억겁(億劫)의 세월 동안 산과 동무하며 지내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고사목, 불현듯 나타난 돼지 떼, 사이좋은 노루 부부(?), 오소리, 살모사, 사나운 들개 무리, 까만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던 산토끼 두 마리, 새벽녘 나무 사이로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태양, 거친 파도와 검푸른 바다 등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신비, 모두가 희망이고 자유였다.
티끌 하나도 가공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땀 흘리며 정상에 올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궂으면 궂은 대로 눈이나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함께 즐기고 싶었다. 겨울철 빙판 등산로에 꼬꾸라져 피투성이 된 얼굴, 상처 난 이마, 수없이 멍든 정강이, 골절된 손가락 등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많았지만, 어찌 자연이라는 큰 스승에게 배우고 익힌 겸손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영국의 저명한 산악인 ‘조지 말로리(1886~1924년)’는 “왜 산에 오르느냐?”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그는 “Because it’s there.” 즉, “산이 거기 있어서 오른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산이 필자에게 물었다.
겸손, 배려, 포용을 배우고 싶었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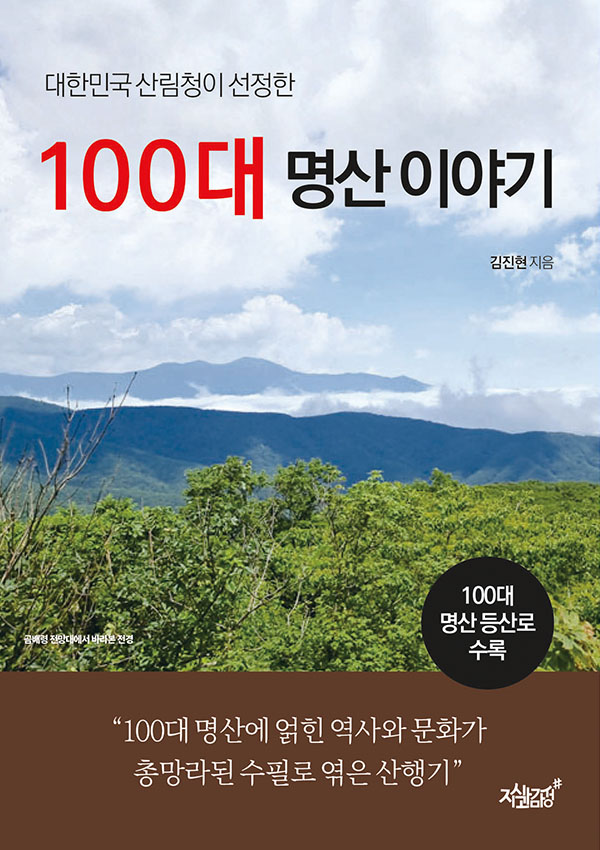

 070-4651-3730
070-4651-3730 ksbookup@naver.com
ksbookup@naver.com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