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도서
신간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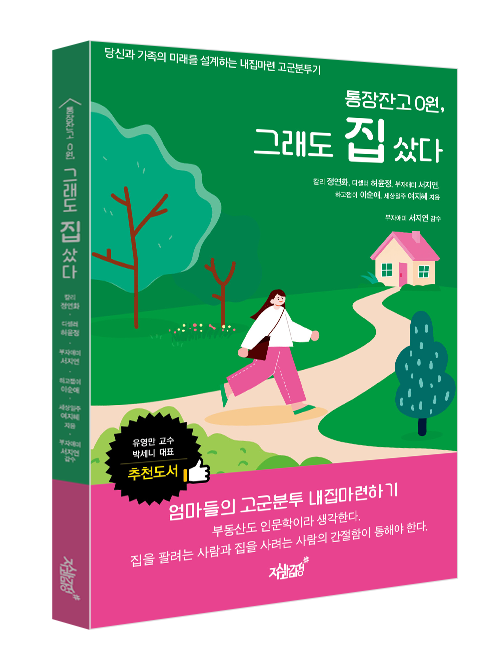
통장 잔고 0원, 그래도 집 샀다
저자 : 부자애미 외 5명 분류 : 경제·경영 발간일 : 2025-08-15 정가 : 16,800원 ISBN : 979-11-392-2741-3엄마들의 고군분투 내집마련하기 《통장잔고 0원, 그래도 집 샀다》는 부동산 투자 비법서를 가장한 성공담이 아니다. 누구보다 평범한, 때로는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은 ‘내 집에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단순하지만 간절했던 꿈을 어떻게 하나하나 현실로 바꿔나갔는지를 기록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전문가도, 부자도 아니다. 어떤 날은 좌절했고, 어떤 날은 무지했고,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집’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놓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히 한 발씩 내딛었다. 이 책에는 화려한 스펙도, 복잡한 수익률도, 숫자 놀음도 없다. 대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좌절과 희망이 엇갈리는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능했던 과정들’을 담았다.이 책을 통해 ‘내집마련’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꿈도 사치도 아닌 당신의 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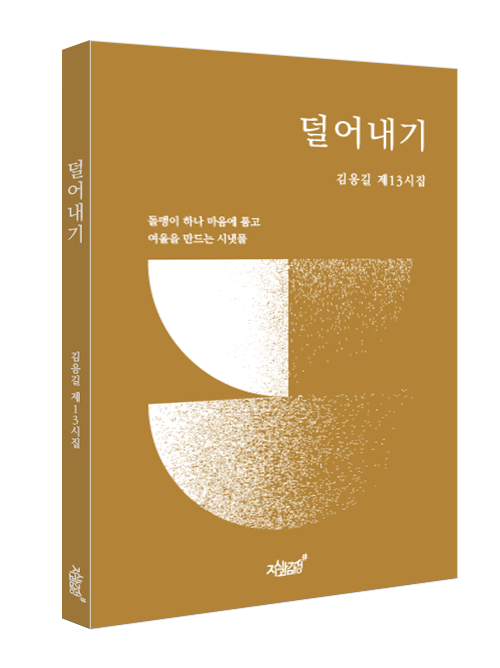
덜어내기
저자 : 김응길 분류 : 문학 발간일 : 2025-08-15 정가 : 17,000원 ISBN : 979-11-392-2737-6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하면 다 보이지요.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할 공간이 필요하고요. 머리도 꽉 차고 마음도 꽉 차고 더 이상 담을 곳 없이 답답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미움도 덜어내고 외로움도 덜어내고 갈등도 덜어내고 덜어내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비워진 곳마다 꿈의 싹이 자라고 열정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리라.”김응길 시인이 덜어내기를 위한 징검돌 138개를 제13시집 《덜어내기》로 엮어 독자를 찾아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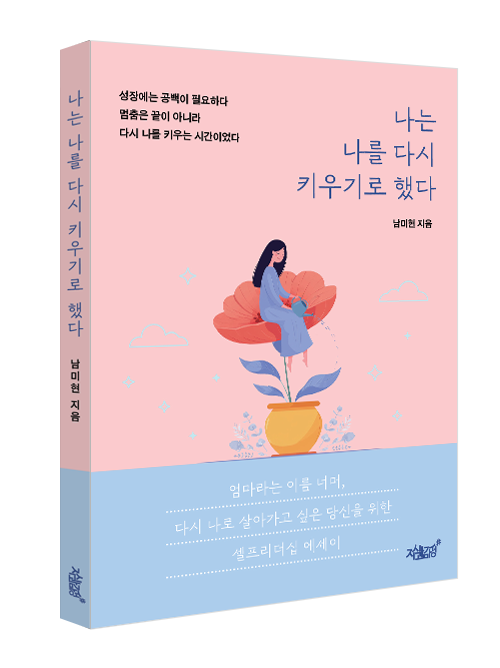
나는 나를 다시 키우기로 했다
저자 : 남미현 분류 : 자기계발 발간일 : 2025-08-15 정가 : 16,700원 ISBN : 979-11-392-2743-7이 책은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나’로 불리던 시간은 멈추고,하루 24시간을 가족과 아이에게 온전히 쏟아온 날들.그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였고,언젠가 다시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다시 키우기로 했다』는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워킹맘, 그리고 다시 일과 꿈을 찾아 도전하는한 엄마의 용기 있는 이야기이자,엄마로서의 삶과 한 개인으로서의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쓴저자의 진솔한 기록입니다. 지금도 많은 엄마들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이 책은 그 물음에 응답하며 조용히 말합니다.“우리는 다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새로운 막을 준비하는 엄마, 여성들에게자신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용기와 현실적인 위로를 전합니다.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과 마주하고,자신만의 길을 다시 그려 나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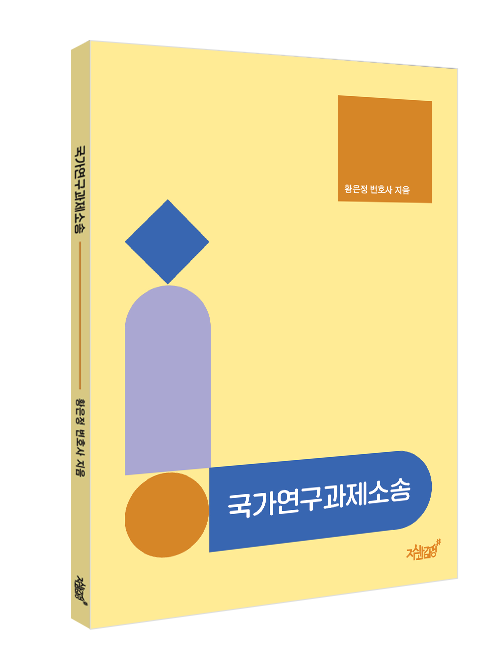
국가연구과제소송
저자 : 황은정 분류 : 정치·사회 발간일 : 2025-08-18 정가 : 18,000원 ISBN : 979-11-392-2744-4『국가연구과제소송』에서는 국가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공계 연구자들이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실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적 이론을 자제하고 쉽게 풀어쓴 책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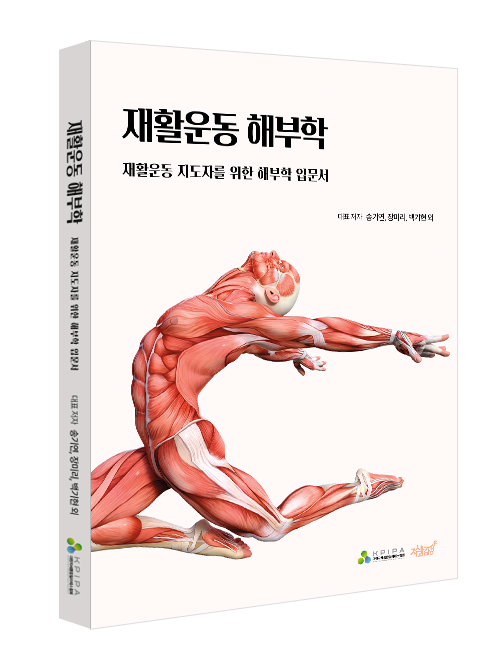
재활운동 해부학
저자 : 송기연, 장미리 분류 : 기술·과학 발간일 : 2025-08-18 정가 : 58,000원 ISBN : 979-11-392-2738-3몸을 이해하는 첫걸음, 재활운동 강사를 위한 해부학 입문서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해부학은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구조 암기가 아닌, 움직임의 해석과 기능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장형 해부학 입문서입니다.해부학과 재활운동을 하나의 언어로 연결하여, 자세 평가부터 움직임 분석, 운동 처방까지 재활운동에 필요한 해부학적 사고력을 기초부터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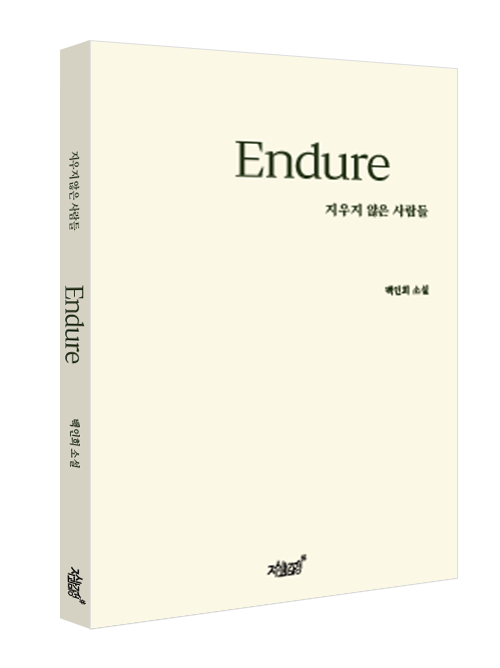
Endure
저자 : 백인희 분류 : 문학 발간일 : 2025-08-19 정가 : 17,000원 ISBN : 979-11-392-2748-2기억을 정제하고 삭제하는 기술이 일상이 된 가까운 미래. “잊으세요, 새로운 당신의 날들이 기다립니다.힘들었던 기억을 지우고 내일을 선물받으세요.” 하지만 기억을 지우면 고통도 사라질까? 삭제된 기억, 남겨진 감정.그리고 지우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기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견뎌야 할까? -

세계의 정보보안법
저자 : 박정인 분류 : 정치·사회 발간일 : 2025-08-20 정가 : 17,000원 ISBN : 979-11-392-2750-5디지털 시대의 약속, 법으로 이어지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뉴스를 보고,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우리는 동시에 ‘기록되고’, ‘분석되며’,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의 답을 향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보보안법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그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전 세계에 데이터 권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철학 아래, 사용자 중심의 정보주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업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CISA, 2015)과 국토안보부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적 목적의 사용을 막는 BOTs Act 등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차례로 도입하며 디지털 주권과 국가 통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3계층 체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과 거버넌스 조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디지털청의 신설은 그 상징이기도 하지요.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법(CSA, 2018)으로 강력한 중앙통제형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면서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인증제도(CSA Cyber Trust)를 통해 실천 가능한 보안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사이버안보전략(2023) 등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이버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제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이중규제, 사각지대, 실효성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그려낸 디지털 사회의 약속과 선택들을 따라가 보려는 여정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강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의 다리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나는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법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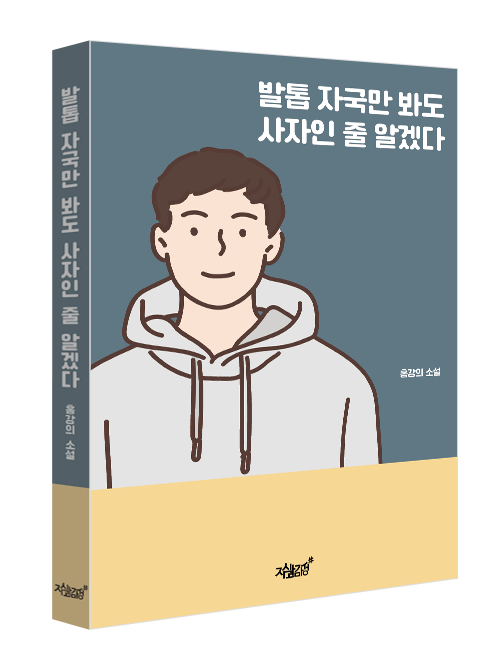
발톱 자국만 봐도 사자인 줄 알겠다
저자 : 홍강의 분류 : 문학 발간일 : 2025-08-20 정가 : 16,700원 ISBN : 979-11-392-2739-0이 책은 ‘역행하고 그물눈처럼 뚫려 있는’ 이질적인 SF 소설집으로 극한의 허구적 가설 속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팽팽한 긴장감, 불안과 대립 그리고 미스터리한 반전이 숨어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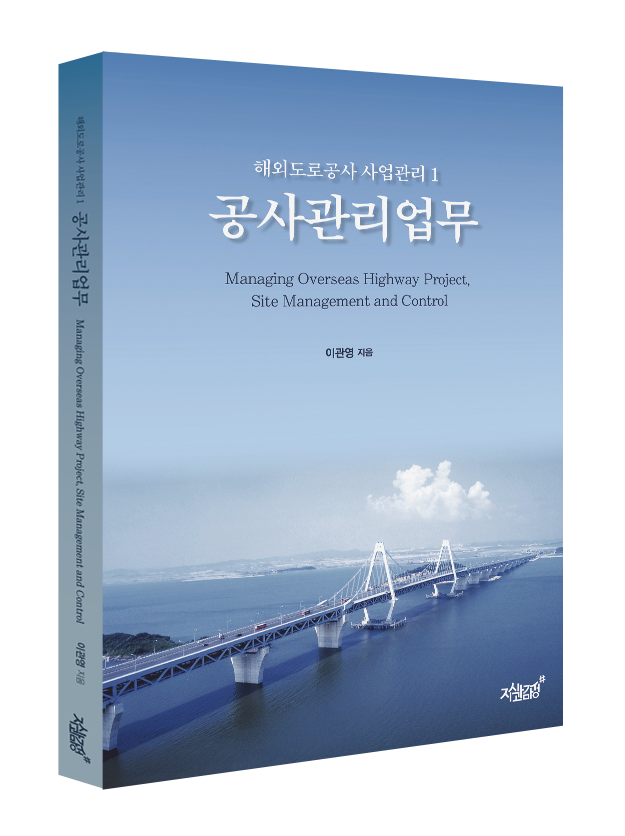
해외도로공사 사업관리 1 공사관리업무
저자 : 이관영 분류 : 기술·과학 발간일 : 2025-08-20 정가 : 17,000원 ISBN : 979-11-392-2736-9현장 엔지니어는 공사 중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수행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시방서 기준에 따라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계약서와 관련 법령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현장 엔지니어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관리의 핵심입니다. 『해외도로공사 사업관리 1 공사관리업무』는 현장의 엔지니어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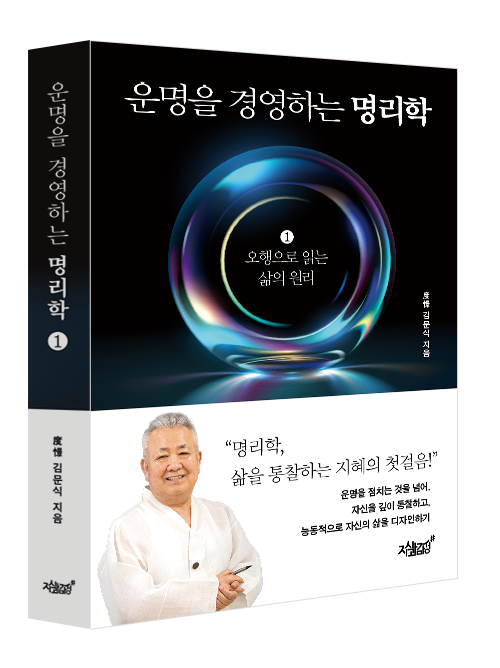
운명을 경영하는 명리학 1
저자 : 김문식 분류 : 인문 발간일 : 2025-08-22 정가 : 52,000원 ISBN : 979-11-392-2771-0명리학은 단순히 길흉화복을 점치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과 같다. 이 책은 27여 년간 3만여 명 이상의 임상 경험과 17년간 명리학 강의를 통한 2,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명리학의 모든 핵심 원리를 쉽고 명쾌한 언어로 풀어낸다. 오행(五行)의 조화로운 기운부터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심오한 관계,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역동적인 원리, 그리고 육신(六神)이 보여주는 복잡한 인간관계까지, 모든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이 책은 추상적인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과 실용적인 조언들은 당신의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삶의 불균형을 지혜롭게 조절하며, 변화하는 운명을 능동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이제, 명리학이라는 지혜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당신의 삶을 이해하며 더욱 빛나게 만들 길을 이 책에서 만나보자.
닫기
출판의뢰 및 원고투고
ksbookup@naver.com
※ 영업시간외 상담은 카카오톡상담 이용
세상과 책을 잇는
마중물같은 출판사
지식과감성#
고객센터 전화상담
 070-4651-3730
070-4651-373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11시 25분 ~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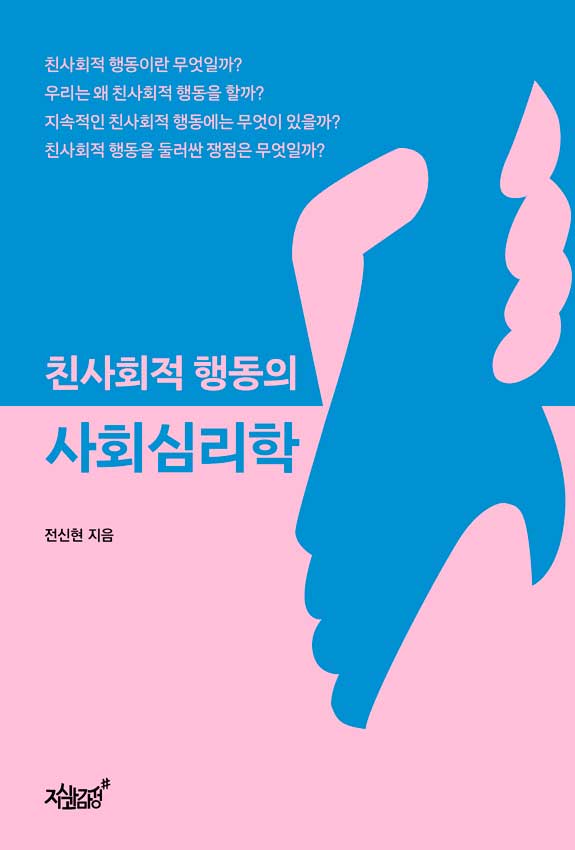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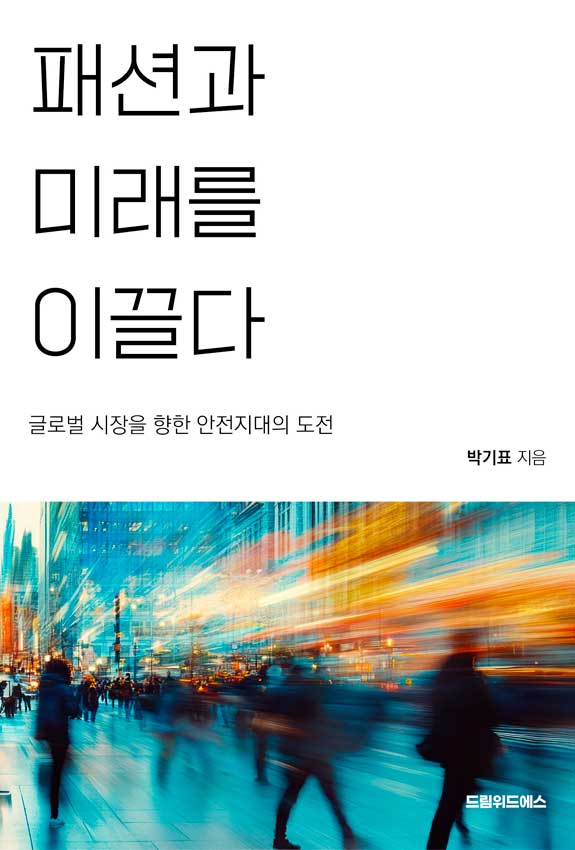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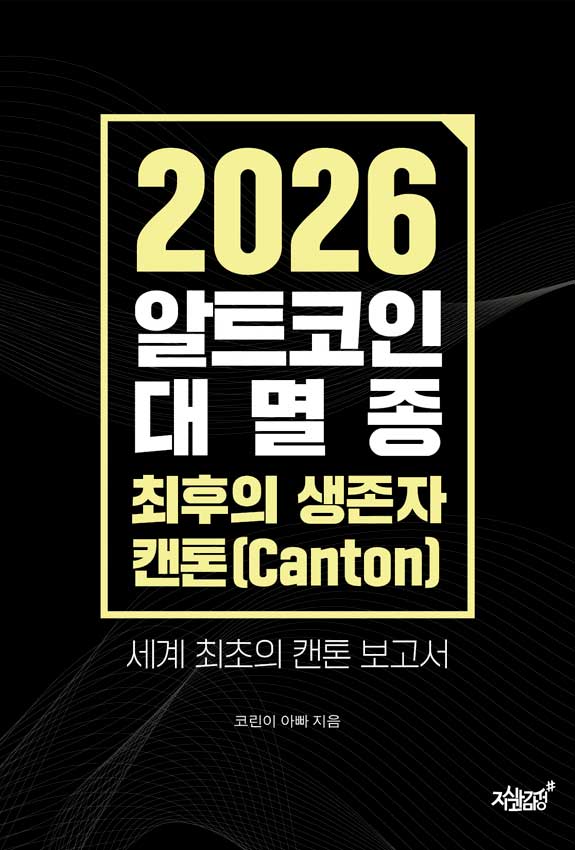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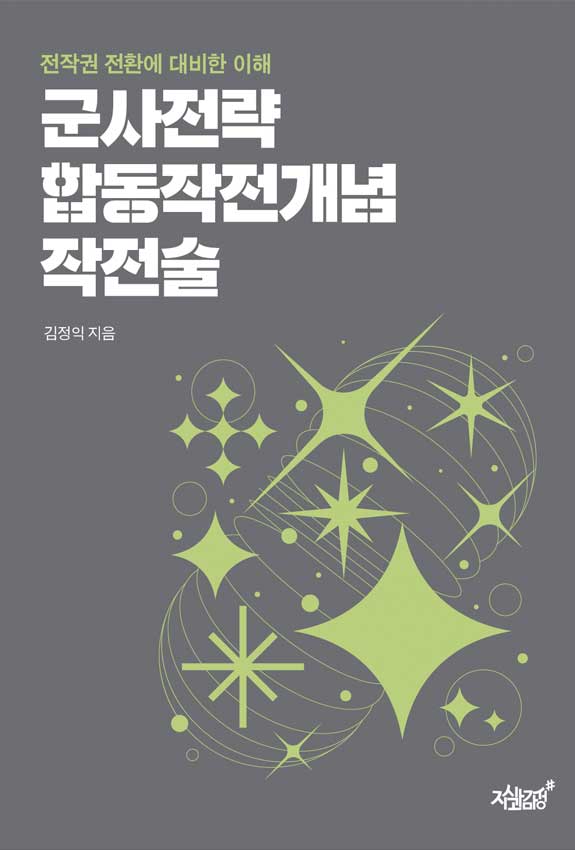
 ksbookup@naver.com
ksbookup@naver.com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지식과감성#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